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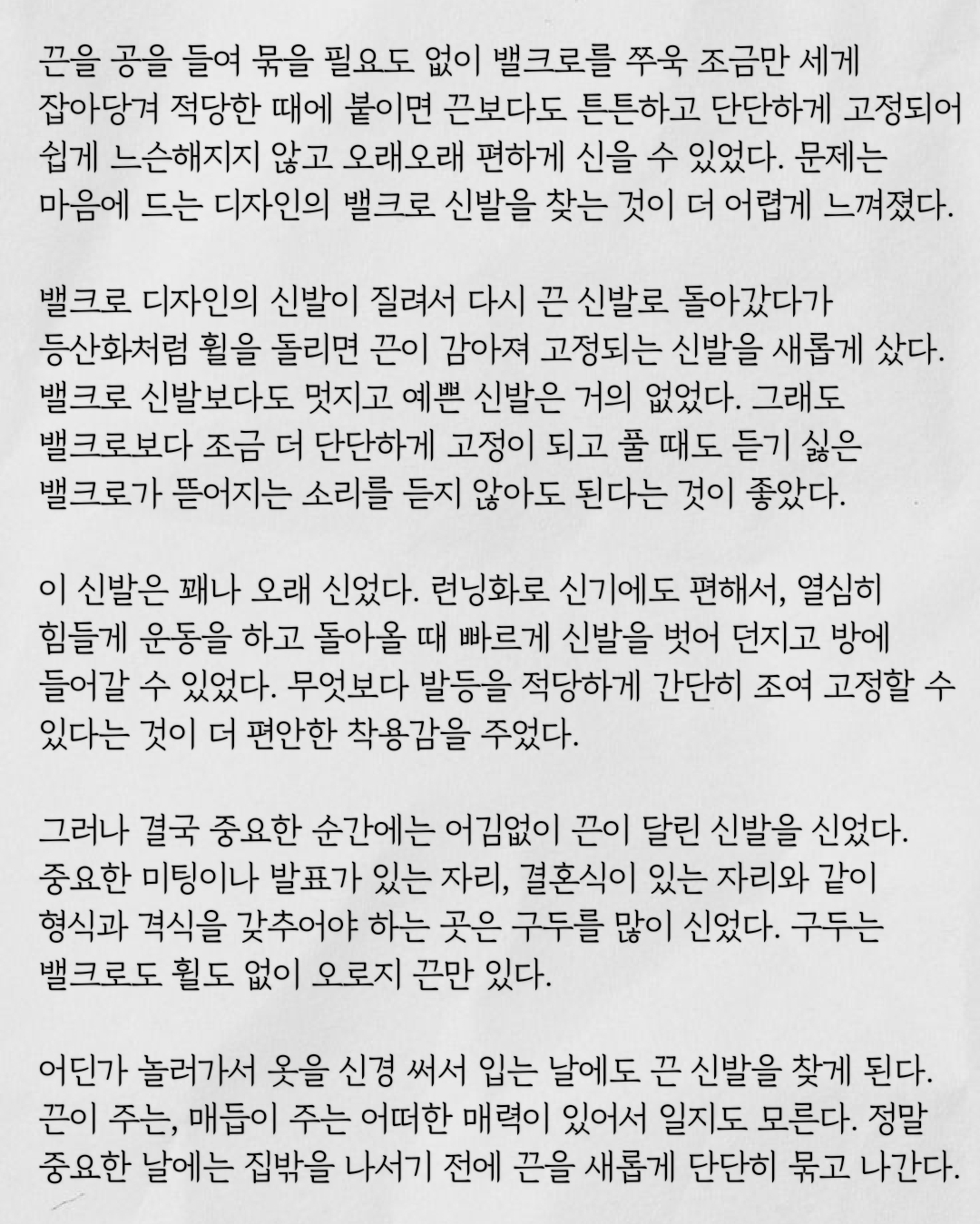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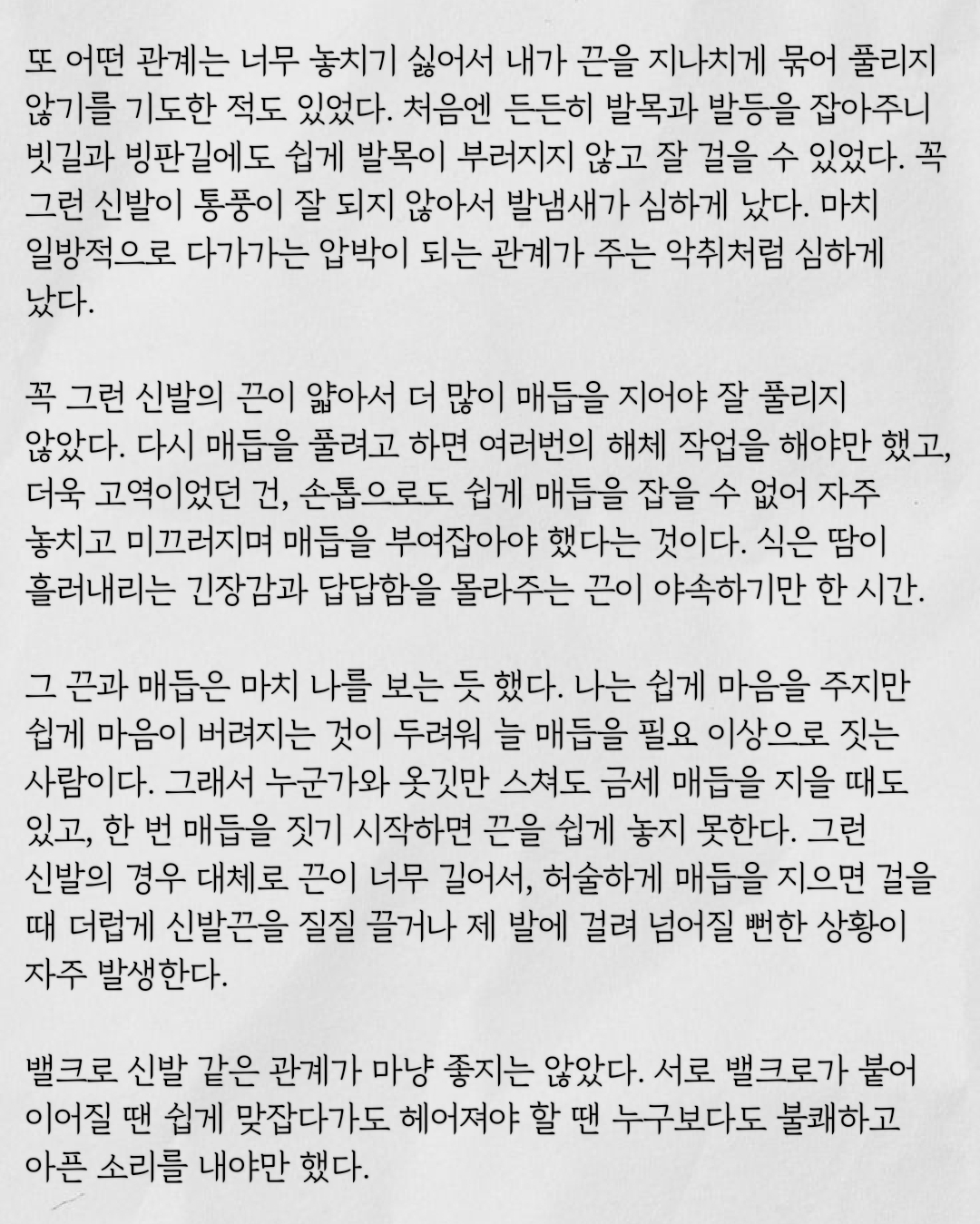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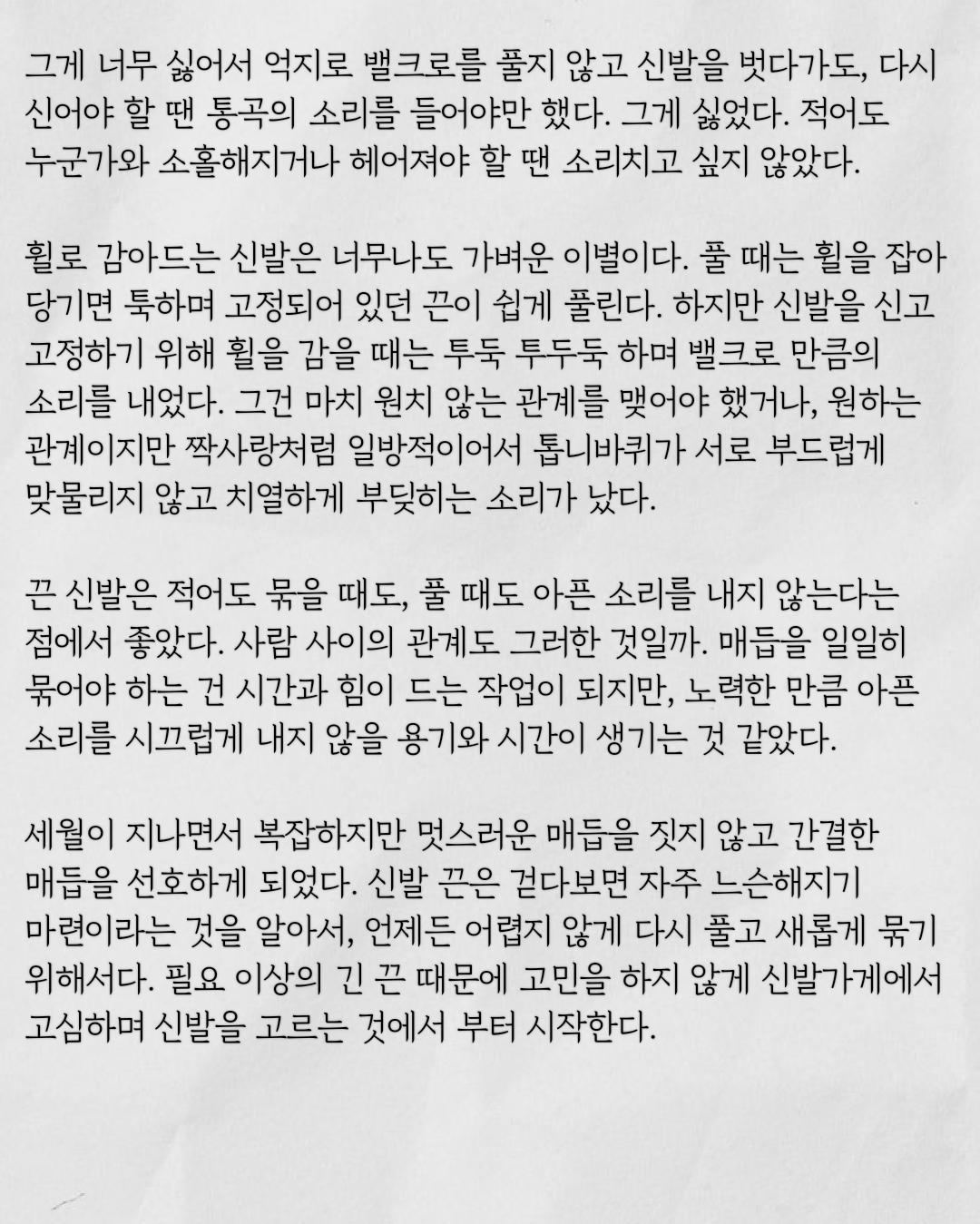



끈이 있는 신발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처음 끈신발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저 벨크로 신발보다 이쁘고 멋있었기 때문이었다. 연습만 한다면 얼마든지 멋있는 매듭을 지어볼 수 있었다. 신발은 같아도 끈을 다채롭게 바꿔보며 멋을 더해볼 수 있었다. 그런 신발이 어설프게 매듭을 묶어 자주 풀리거나 느슨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고쳐 매면 되니까.
어떤 신발은 처음 살 때부터 같이 온 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서 불필요한 매듭을 몇번이고 더 묶어야 적당한 길이로 맺어 떨어졌다. 신발을 반품하고 바꾸기에는 귀찮고, 끈만 바꾸자니 신발에 맞는 색과 길이의 끈을 찾아다니는 것은 더 고역이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긴 끈을 주렁주렁 열매처럼 매듭을 묶어 신고 다니기도 했다. 그것조차 거추장스러울 때는 신발 안쪽으로 끈을 욱여넣어 감췄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걸리적거리는 끈이 야속하기만 해서 결국 신발장 구석행이다.
단단하게 꽉 묶어도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걸음과 발동작 때문에 점점 끈은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단단히 묶어 둔 끈을 다시 푸는 것도 일이 되곤 한다. 대충 묶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 끈이 없는 밸크로 신발을 산 적이 있다.
끈을 공을 들여 묶을 필요도 없이 밸크로를 쭈욱 조금만 세게 잡아당겨 적당한 때에 붙이면 끈보다도 튼튼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쉽게 느슨해지지 않고 오래오래 편하게 신을 수 있었다. 문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밸크로 신발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
밸크로 디자인의 신발이 질려서 다시 끈 신발로 돌아갔다가 등산화처럼 휠을 돌리면 끈이 감아져 고정되는 신발을 새롭게 샀다. 밸크로 신발보다도 멋지고 예쁜 신발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밸크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풀 때도 듣기 싫은 밸크로가 뜯어지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다.
이 신발은 꽤나 오래 신었다. 런닝화로 신기에도 편해서, 열심히 힘들게 운동을 하고 돌아올 때 빠르게 신발을 벗어 던지고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발등을 적당하게 간단히 조여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편안한 착용감을 주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끈이 달린 신발을 신었다.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는 자리, 결혼식이 있는 자리와 같이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곳은 구두를 많이 신었다. 구두는 밸크로도 휠도 없이 오로지 끈만 있다.
어딘가 놀러가서 옷을 신경 써서 입는 날에도 끈 신발을 찾게 된다. 끈이 주는, 매듭이 주는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정말 중요한 날에는 집밖을 나서기 전에 끈을 새롭게 단단히 묶고 나간다. 한정식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집에 돌아오기 까지 벗지 않을 각오로 단단히 묶는다.
어느 날은 신경을 써야 하는 날이라서 구두를 닦고 새롭게 끈을 단단히 묶어 집을 나섰다.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고, 기차에서 내려서 좀 많이 걸어야 했던 날이다. 그래서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꽁꽁 묶었는데, 되려 그것이 발을 옥죄어 금세 발이 퉁퉁 붓고 아파왔다. 벗어서 신발 끈을 다시 묶기에도 애매한 날이었다.
그렇게 통증을 참으며 딱딱한 구두로 오랜시간 서 있고 걷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구두를 벗기도 전에 방바닥에 쓰러져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한동안 누워있었다. 내가 잘못 묶은 끈의 압박 때문에 나를 지탱해오는 발이 고생을 많이 했던 날, 어딘가 서러움이 폭발했다.
내가, 너와 내가, 우리가, 사람이, 사람들이 신발끈과 같았다. 묶으면 풀어야 하는 끈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 무언가를 서로가 연결한다는 것이 된다.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인연은 너무 잘 맞아서 오래오래 단단하고 알맞게 매듭이 지어져 오래 걷기에도 좋았다. 반면에 너무 느슨하게 묶었던 관게는 누가 먼저 손을 놓았든 상관없이 자연스레 서로가 멀어지기도 했다.
또 어떤 관계는 너무 놓치기 싫어서 내가 끈을 지나치게 묶어 풀리지 않기를 기도한 적도 있었다. 처음엔 든든히 발목과 발등을 잡아주니 빗길과 빙판길에도 쉽게 발목이 부러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었다. 꼭 그런 신발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발냄새가 심하게 났다. 마치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압박이 되는 관계가 주는 악취처럼 심하게 났다.
꼭 그런 신발의 끈이 얇아서 더 많이 매듭을 지어야 잘 풀리지 않았다. 다시 매듭을 풀려고 하면 여러번의 해체 작업을 해야만 했고, 더욱 고역이었던 건, 손톱으로도 쉽게 매듭을 잡을 수 없어 자주 놓치고 미끄러지며 매듭을 부여잡아야 했다는 것이다.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긴장감과 답답함을 몰라주는 끈이 야속하기만 한 시간.
그 끈과 매듭은 마치 나를 보는 듯 했다. 나는 쉽게 마음을 주지만 쉽게 마음이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늘 매듭을 필요 이상으로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와 옷깃만 스쳐도 금세 매듭을 지을 때도 있고, 한 번 매듭을 짓기 시작하면 끈을 쉽게 놓지 못한다. 그런 신발의 경우 대체로 끈이 너무 길어서, 허술하게 매듭을 지으면 걸을 때 더럽게 신발끈을 질질 끌거나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밸크로 신발 같은 관계가 마냥 좋지는 않았다. 서로 밸크로가 붙어 이어질 땐 쉽게 맞잡다가도 헤어져야 할 땐 누구보다도 불쾌하고 아픈 소리를 내야만 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억지로 밸크로를 풀지 않고 신발을 벗다가도, 다시 신어야 할 땐 통곡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게 싫었다. 적어도 누군가와 소홀해지거나 헤어져야 할 땐 소리치고 싶지 않았다.
휠로 감아드는 신발은 너무나도 가벼운 이별이다. 풀 때는 휠을 잡아 당기면 툭하며 고정되어 있던 끈이 쉽게 풀린다. 하지만 신발을 신고 고정하기 위해 휠을 감을 때는 투둑 투두둑 하며 밸크로 만큼의 소리를 내었다. 그건 마치 원치 않는 관계를 맺어야 했거나, 원하는 관계이지만 짝사랑처럼 일방적이어서 톱니바퀴가 서로 부드럽게 맞물리지 않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끈 신발은 적어도 묶을 때도, 풀 때도 아픈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았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한 것일까. 매듭을 일일히 묶어야 하는 건 시간과 힘이 드는 작업이 되지만, 노력한 만큼 아픈 소리를 시끄럽게 내지 않을 용기와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복잡하지만 멋스러운 매듭을 짓지 않고 간결한 매듭을 선호하게 되었다. 신발 끈은 걷다보면 자주 느슨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서, 언제든 어렵지 않게 다시 풀고 새롭게 묶기 위해서다. 필요 이상의 긴 끈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게 신발가게에서 고심하며 신발을 고르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가끔은 인터넷에 매듭을 잘 묶는 법을 검색하고 따라해 본다.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고 예쁜 매듭을 짓는 법은 많아도, 깔끔하고 쉽게 매듭을 풀어 헤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관계를 시작하는 건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묶었던 관게를 정리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까.
오래 신은 신발은 밑창이나 앞, 또는 발꿈치가 닳아 망가지기 마련이지만 신발끈이 끊어져서 신발을 버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업었다. 가족들의 핏줄이 질기다는 말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과, 너와 나의 인연은 질긴 악연이라는 말처럼 신발끈도, 사람 사이의 끈도 질긴 것인가 보다.
오늘 신었던 구두의 굽은 적당히 높았고, 중요한 만남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에 알맞은 딱딱한 밑창이었는데, 늦은 밤 집에 돌아온 발은 너무나도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위해서는 적당할 지는 몰랐으나 나에게는 적당하지 않았던 매듭. 구두의 끈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손톱을 자르지 않아서 충분히 길었는데 매듭이 잡히지 않았다.
내 마음에 묶어둔 매듭 또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기꺼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인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 매듭을 단단히 묶지 않을 거니까. 심하다면 칼이나 가위로 그 매듭을 도려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매듭이 내 마음에 묶여 있다는 것이 쓰라렸다.
나는 말 한 마디도 마음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직접 대면하여 입과 입 사이로 말과 마음이 오고가지 않고, 문자로 오고가는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지 않아도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안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신발을 신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세상이다. 밸크로도 휠도 끈도 필요 없다. 심지어 신발도 맨발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들과의 대화는 끈이 없어 매듭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지내기도 한다. 사실은 나는 발이 없어도 끈을 가져와 매듭을 묶지만 쉽게 대화를 나누고 사라지는 세상이기에 상대방에겐 매듭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자로 오고가는 대화와 관계속에서도 신발을 신고 끈으로 매듭을 단단히 묶는 사람이다.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된다고 밸크로 신발을 신어도 된다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과 마음이 오고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매듭을 묶고 싶다.
그렇기에 나 혼자 매듭을 묶는 관계속에서 늘어진 끈을 붙잡고 만지작 거리며 사라진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며 홀로 외로워 하고 있는 나를 본다. 너무나도 많은 끊어진 매듭이 가시밭길처럼 내 앞길에 놓여 있어, 부드러운 가시에 찔리며 걷는 기분이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되는 정도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슬프다.
누구에게나 사랑 받을 수 없고, 나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을 부정하며 사랑하고 싶다. 자주 느슨해져도 괜찮으니 함께 다시 매듭을 묶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싶다. 사랑하기 위해 상처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득 안고 나아가고 싶다.
신발끈이 풀리지 않을 때, 덜 아프며 끈을 풀고 다시 묶고 싶다.
신발끈이 풀리더라도 다시 묶으면 된다고 믿고 싶다.
다시 묶으면 함께 손을 맞잡고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싶다.
'화운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토리묵 (1) | 2025.05.25 |
|---|---|
| 부끄러워서 살아보려고요 (0) | 2025.04.20 |
|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0) | 2025.04.16 |
| 일시정지 (0) | 2025.03.29 |
| 작별할 용기 (0) | 2025.03.21 |



